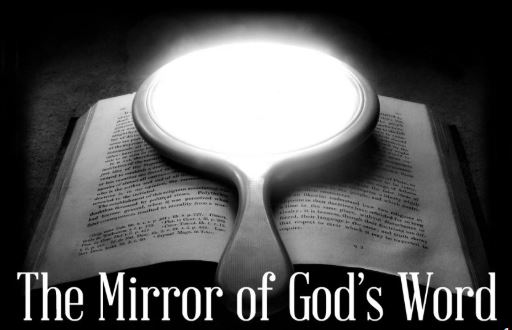
필자는 서재에서 뒤뜰의 포플러(미류)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전에 읽었던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를 떠올렸다. 이 작품은 가난한 화가 수(Sue),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는 존시(Johnsy), 그리고 늙은 화가 베이먼(Behrman)의 이야기이다.
찬바람이 불던 11월의 어느 날, 존시는 폐렴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다. 의사는 그녀가 살아날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도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 후 존시는 창밖의 담쟁이덩굴을 바라보며 잎을 세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잎은 하나둘 떨어져 마지막 한 잎만이 남았다. 존시는 그 잎을 바라보며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다. 담쟁이덩굴에 마지막 잎새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수는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존시의 부탁으로 커튼을 연 수는 깜짝 놀랐다. 그 거센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잎새가 여전히 줄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도, 그다음 날도 잎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베이먼이 폭풍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린 그림이었다. 그는 그렇게 걸작을 남기고 이틀 후 세상을 떠났다. 그 덕분에 존시는 다시 살아야 할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필자는 주인공 존시의 생각을 사회학자 찰스 호턴 쿨리(Charles Horton Cooley)의 ‘자아거울이론’(the looking-glass self) 에 비추어 보았다.
쿨리는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며 자아를 형성한다”고 했다. 즉,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은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는 사회적 거울의 반사체이다. 둘째, 개인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자아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 친구의 평가, 사회의 기준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해 왔다. 그러나 그 거울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상처받고 정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아는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안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세상의 거울은 외모를 비추고 유행에 따라 변하지만, 말씀의 거울은 변함없이 진리를 비춘다.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사무엘상 16:7)고 말씀한다.
세상은 외모, 성공, 소유, 명예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러한 거울은 내면을 비추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흐리게 만든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다.“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거울이다. 말씀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동시에 비춰준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성도는 세상의 시선 대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창세기 1:27).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그분의 성품과 사랑, 거룩함, 관계성을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재의 원형이자 참된 거울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거울은 깨졌고, 인간은 세상의 평가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자 참된 거울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깨진 거울을 복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던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마지막 잎새」의 존시는 세상의 거울을 보며 자아를 잃어가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잎새를 ‘절망’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병든 자신, 가난하고 외로운 존재로서 세상이 자신을 ‘실패자’로 본다고 믿었다. 그러나 베이먼은 존시 안에서 가능성과 생명을 보았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마지막 잎을 그려 넣었다. 그의 희생은 존시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은혜의 거울이 되었다.
존시가 베이먼의 희생에서 새 생명의 빛을 본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한다. 세상의 거울은 인간의 시선으로 나를 비추지만, 말씀의 거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
세상의 거울은 꾸며진 나를 보여주지만, 말씀의 거울은 참된 나를 찾아준다.
<홍해 선교회 조완길 목사>





